
너무 잦은 장거리 이동 때문인지, 열악한 호텔에서 객지 숙박을 연달아 한 탓인지, 눈이 오면서 차가워진 공기 탓인지 금요일 밤부터 인후통과 함께 몸살이 찾아와버렸다. 밤새도록 오한이 들어 벌벌,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냈다.

그 와중에도 우리 고양이 2호의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하고 왔다. 우리 2호 고양이는 췌장 수치가 높고 송곳니에 구멍이 있어서 레진으로 때웠다. 발견 못했으면 흡수성병변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건강검진은 못해도 스케일링만이라도 꾸준히 해야겠다.

우리 2호 고양이는 2살 무렵 6층 집에서 땅으로 낙상을 한 적이 있다. 발코니 문이 활짝 열린 채 2호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아득히 냐옹 냐옹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떨어졌구나" 라는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처럼 흘러내렸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는지,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지 하얗게 지워져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눈에 보이질 않는 고양이 이름만 외치며 동동거릴때, 길 건너 편의점 사장님이 "혹시 고양이를 찾냐"며 위치를 알려주셨다. 가르쳐준 그 위치에 풀숲을 헤쳐보니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의 2호 고양이가 웅크려있었다.

어디가 부러졌을니 모르지 감싸서 데려가라고 사장님은 기꺼이 겉옷을 벗어주셨고, 나는 고양이를 싸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천리길 떨어져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는 다급히 병원을 수소문했고 이른 아침 고맙게도 한 수의사님이 얼른 데려오라 하셨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편으로 넘어가려는 숨을 헐떡이며 잡고 있던 우리 고양이. 나와 일상을 나눈 존재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려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손을 벌벌 떨었다. 2주간의 투병 후 퇴원하는 날, 수의사 선생님은 우리 고양이에게 "작지만 강한 고양이"라는 멋진 말을 해 주셨다. 그 작지만 강한 고양이가 이제 7살이다.

고모 병문안을 다녀왔다. 항상 맵시있고 발랄했던 우리 고모. 고모의 집은 가게에 딸린 작은 방이 전부였지만 어린시절 나에겐 최고의 어드벤처 천국이었다. 나는 학교를 마치고 불쑥 고모네로 가곤 했고, 그러면 고모는 뜨겁게 지져놓은 구들방 안쪽으로 나를 들여보냈다. 고모는 쉬는 시간에 학교로 만두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학교로 찾아와서 알려준 것도 고모였다. 시술 후 기력이 쇠해보이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고모. 나의 양친 모두 형제가 많은 덕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 어느 형제에게도 민폐가 되지 않게 작지만 단단한 세계를 일궈오신 덕에, 나는 여러 명의 고모 이모 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컸다. 친척 어른들의 사랑을 받은 기억은, 나의 낙관적인 세계관의 밑천이 되었다.

몸이 점점 더 안좋아져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괴로웠다. 한가지 더, 한가지 더- 끝날 듯 끝날 듯 말씀을 붙여가시는 목사님께 짜증마저. 그러면서 깨달았다. 아무리 금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든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벼르던 쌀국수 집에서 소고기 쌀국수와 나의 소울푸드 쏨땀을 시켜먹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캠핑 냄비채로 먹은. 뜨끈한 쌀국수를 먹으니 잠시나마 오한이 멈추고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이웃집 찰스에 캐나다 출신 서명원 신부가 나왔고, 그 분이 꾸려가는 농부의 삶을 몰입해서 보았다. 나도 저렇게 자급자족 공동체를 꾸려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잠이 들어버렸다.


침대에 내내 누워있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던 우리 고양이. 이런 저런 짐을 한가득 챙겨 나서는데 야옹이들을 두고 나서려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언제쯤이나 우리 야옹이들과 온전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정신없이 역마처럼 나돌아다니는 나를 만나 벌써 7살 하고도 절반이나 지나버린 우리 고양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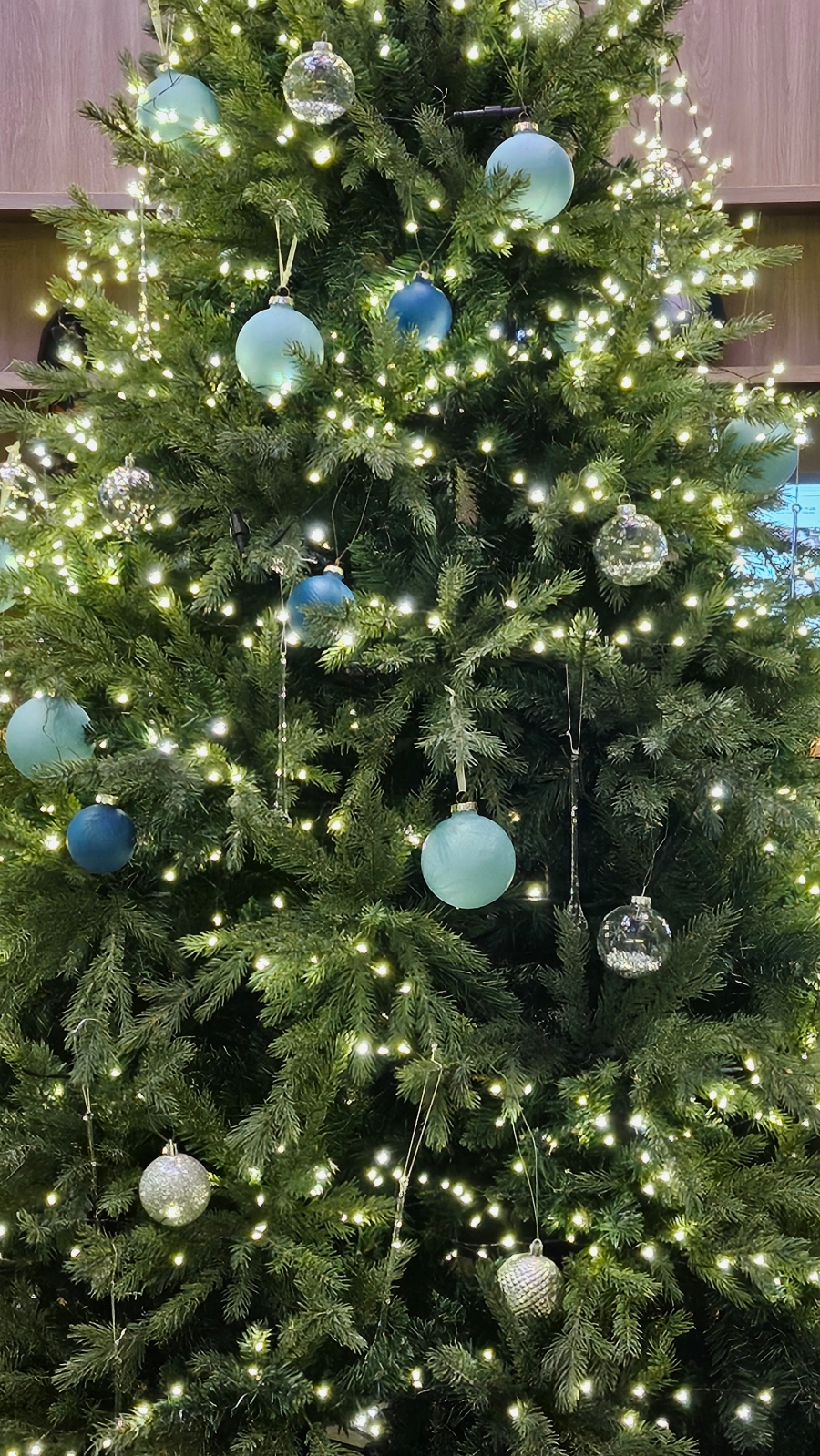
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손가락 하나까지 기력이 남지 않아 눈을 감고 왔다. 나의 육신은 이렇게 멈춰있지만 영은 온전하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서명원 신부님 말씀에, 농사만 지으면 짐승(밭소)가 되고 글만 읽으면 도깨비가 되기에, 결국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육신과 영혼이 그런 관계인 것 걑다.

몸이 개점 휴업을 해버렸는데 영혼이라고 멀쩡할리 있겠냐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여전히 그대로이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설교에 짜증이 나더라도 예배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듯. 육신이 멈추어도 내 안에 주신 지혜의 샘도 그대로이고, 존귀와 힘이 나의 의복되게 하신 것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 조금씩 몸의 기력이 돌아오는 것 같다.
'주말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월 둘째주_그럼에도 버티는 것 (0) | 2025.04.14 |
|---|---|
| 4월 첫째주_벚꽃 모티베이션 (0) | 2025.04.09 |
| 12월 셋째 주_비디오 천국 (0) | 2024.12.15 |
| 12월 둘째주_소년이 왔다, 내게도 (2) | 2024.12.08 |
| 12월 첫째주_김치와 더불어 담아가는 것들 (0) | 2024.12.01 |